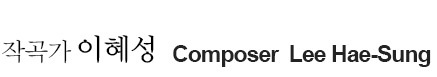작곡가의 눈으로 본 건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1 10:27관련링크
본문
건축세계 (Archiworld)
창간 10주년 특집 6월호에 실린
칼럼 이방인의 건축 중에서 작곡가의 눈으로 본 건축 전문입니다.
작곡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필자는 작곡가를 “소리 건축가”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인지 건축에 대해 평소 무관심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전문적인 부분을 안다고 할 수는 없기에 나 자신을 우선 이방인으로 인정하면서도 과연 “건축을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우문을 던져본다.
필자는 건축물을 미적인 관점에서 우선 바라보게 된다. 비엔나에서의 긴 유학시절은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유럽의 건축물을 하나의 예술 분야로 인식하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훌륭한 건축물은 우리에게 시각적인 기쁨을 선사한다. 바라만 보아도 꼭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건축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서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기대를 갖는 만큼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건축들이 훨씬 많다. 그러한 실망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 전용 공간조차 예외가 아니다.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은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선과 어울리지 못한 채 어색하게 놓여 있으며, 웅장한 규모만으로 한 때를 풍미하던 세종문화회관도 이제는 주위 건물에 가려진채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구나, 복잡한 서울을 떠나 찾아본 지방의 문화예술회관들조차 대부분 세종문화회관을 답습한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LG arts center는 우선 진부하지 않아서 반갑지만 대형 유리건물 속의 부분으로 존재하기에 홀 안과 밖에서 예술적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반면 공간 사옥은 아주 작지만 포근하다.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세월이 흘러도 작은 공간의 아기자기함이 내 집처럼 친근하면서 손때 묻은 세월이 불편하지 않다. 종교적 건물 중에서는 단순미와 소박함이 강조된 수서동 성당이 독일 어느 중세의 사원 같아 그 안에서 고요를 느낄 수 있어서 늘 좋고, 대치동 성당의 분위기도 스태인 글라스와 조화를 이루어 바라보는 곳 마다 기쁨으로 와 닿는다. 엮사를 느끼게 하는 종묘정전과 비원은 물론 모든 서울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 보고 싶은 곳이다. 해질녘 천년의 무게가 차곡차곡 퇴적되어 있는 통도사의 고즈넉한 경내를 거닐던 시간은 저물어가는 하늘에 퍼지는 향내를 타고 어느새 과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들 모두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건축물이어서 지극히 조화롭고 평화롭다.
작곡가는 들리는 것만큼 표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을 자주한다. 건축도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예술가의 작품은 그 사람의 현재 수준을 그대로 옮겨 놓은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예술가는 더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늘 온전히 깨어있어야만 한다고 필자는 굳게 믿는다.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있어서 교향곡을 작곡하는 일은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시각적 건축이 아닌 소리의 건축 차원에서 소리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에는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 실제로 교향곡처럼 스케일이 큰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모든 기가 다 작품으로 빠져나간 것을 느낀다. 건물에 담겨진 건축가의 혼이 나 같은 이방인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예술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 볼 때 훌륭한 건축물을 보고 필자가 느끼는 감동이 건축가의 그것과 전혀 상반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작곡가의 입장에서 볼 때, 졸작은 청중과 연주자를 심하게 고문 하고, 걸작은 청중과 연주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애무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잘 못 지어진 건물은 보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예술적으로 지어진 건물은 시각적 기쁨과 함께 그 공간 안에서 긴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절대 권한을 부여한다. 바로 걸작을 접하는 순�:壙� 건축가에 대한 경외심은 영원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졸작이라도 음악과 건축은 비교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 수준이하의 음악작품은 대중들로부터 곧 외면되어 사장되므로 졸작이 주는 고문의 시간이란 극히 짧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억지로 들을 것을 강요할 수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마구지은 건축물은 그 흉물스러움으로 어쩔 수 없이 바라보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늘 괴롭힐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실례로, 필자는 거주 공간과 작업공간에서 이미 건축물이 주는 고문을 여러 차례 당해보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졸작 건물이 갖는 파워는 음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며,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졸작 건축가의 힘은 동급의 작곡가에 비해 막강하다고 하겠다. 물론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작품이 비전문가로부터 졸작이라는 혹평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입장에서, 건축에 대해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한 작곡가의 건축에 대한 편린을 건축가들이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일까 조금은 걱정이 된다. 특히, 위에 언급한 대형 건물설계자나 그 건물을 다르게 평가하는 분에게는 필자의 혹평에 기분 좋을 리 없겠지만 그만큼 건축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나는 미래에 떠나고 싶은 행복한 여행계획을 세우는 기쁨을 즐기는 편이다. 필자가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보는 두 가지는 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리고 낯섦과 경이로 다가오는 건축물들이다. 가깝게는 소쇄원과 부석사를 그리고 멀게는 뤼꼬브뷔제(Le Corbusier)의 롱샹성당과 가우디(Antoni Gaudi)의 사그라다 화밀리아 (Sagrada Familia)를 만나게 될 즐거움을 꿈꾸고 있다. 외국을 여행할 때 커다란 현대식 호텔보다는 그네들의 삶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숙소를 더 선호하는데, 이 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백년이 넘은 고옥(古屋)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처마를 멋들어지게 늘어뜨린 기와집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최근에는 펜션들이 마치 산불처럼 번져 농촌의 전원 풍경을 바꿔놓고 있으며, 도시에서는 아파트의 재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이라는 현실적인 명분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우리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추해지고 지저분해 지는 걸까?” 하는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고풍스러워 질 수는 없는 것인가? 유럽의 건축물처럼 수 십, 수 백년 동안 유지되도록 꼭 그렇게 지을 수는 없더라도, 좀 더 여유롭고 아름답고 개성 있게 지어져 세월의 흔적을 저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건축물을 도심 곳곳에서 만나고 싶은 바램이다. 오래된 현악기일수록 더 깊은 울림을 주듯이, 늘 우리 곁에 보금자리처럼 남아있어서 그저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공명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나 장소가 몹시도 그립다. 외국인들도 나처럼 우리 건축가의 작품을 보기 위한 여행 계획으로 설레이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며, 안전하고 우아하고 쾌적하여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한 삶의 터전을 주는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잘 배치된 아름다운 도시가 여러분을 통해 설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05년 5월19일
소리건축가 이혜성 /경원대학교 작곡과교수
창간 10주년 특집 6월호에 실린
칼럼 이방인의 건축 중에서 작곡가의 눈으로 본 건축 전문입니다.
작곡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필자는 작곡가를 “소리 건축가”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인지 건축에 대해 평소 무관심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전문적인 부분을 안다고 할 수는 없기에 나 자신을 우선 이방인으로 인정하면서도 과연 “건축을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우문을 던져본다.
필자는 건축물을 미적인 관점에서 우선 바라보게 된다. 비엔나에서의 긴 유학시절은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유럽의 건축물을 하나의 예술 분야로 인식하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훌륭한 건축물은 우리에게 시각적인 기쁨을 선사한다. 바라만 보아도 꼭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건축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서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기대를 갖는 만큼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건축들이 훨씬 많다. 그러한 실망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 전용 공간조차 예외가 아니다.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은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선과 어울리지 못한 채 어색하게 놓여 있으며, 웅장한 규모만으로 한 때를 풍미하던 세종문화회관도 이제는 주위 건물에 가려진채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구나, 복잡한 서울을 떠나 찾아본 지방의 문화예술회관들조차 대부분 세종문화회관을 답습한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LG arts center는 우선 진부하지 않아서 반갑지만 대형 유리건물 속의 부분으로 존재하기에 홀 안과 밖에서 예술적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반면 공간 사옥은 아주 작지만 포근하다.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세월이 흘러도 작은 공간의 아기자기함이 내 집처럼 친근하면서 손때 묻은 세월이 불편하지 않다. 종교적 건물 중에서는 단순미와 소박함이 강조된 수서동 성당이 독일 어느 중세의 사원 같아 그 안에서 고요를 느낄 수 있어서 늘 좋고, 대치동 성당의 분위기도 스태인 글라스와 조화를 이루어 바라보는 곳 마다 기쁨으로 와 닿는다. 엮사를 느끼게 하는 종묘정전과 비원은 물론 모든 서울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 보고 싶은 곳이다. 해질녘 천년의 무게가 차곡차곡 퇴적되어 있는 통도사의 고즈넉한 경내를 거닐던 시간은 저물어가는 하늘에 퍼지는 향내를 타고 어느새 과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들 모두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건축물이어서 지극히 조화롭고 평화롭다.
작곡가는 들리는 것만큼 표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을 자주한다. 건축도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예술가의 작품은 그 사람의 현재 수준을 그대로 옮겨 놓은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예술가는 더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늘 온전히 깨어있어야만 한다고 필자는 굳게 믿는다.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있어서 교향곡을 작곡하는 일은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시각적 건축이 아닌 소리의 건축 차원에서 소리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에는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 실제로 교향곡처럼 스케일이 큰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모든 기가 다 작품으로 빠져나간 것을 느낀다. 건물에 담겨진 건축가의 혼이 나 같은 이방인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예술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 볼 때 훌륭한 건축물을 보고 필자가 느끼는 감동이 건축가의 그것과 전혀 상반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작곡가의 입장에서 볼 때, 졸작은 청중과 연주자를 심하게 고문 하고, 걸작은 청중과 연주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애무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잘 못 지어진 건물은 보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예술적으로 지어진 건물은 시각적 기쁨과 함께 그 공간 안에서 긴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절대 권한을 부여한다. 바로 걸작을 접하는 순�:壙� 건축가에 대한 경외심은 영원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졸작이라도 음악과 건축은 비교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 수준이하의 음악작품은 대중들로부터 곧 외면되어 사장되므로 졸작이 주는 고문의 시간이란 극히 짧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억지로 들을 것을 강요할 수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마구지은 건축물은 그 흉물스러움으로 어쩔 수 없이 바라보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늘 괴롭힐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실례로, 필자는 거주 공간과 작업공간에서 이미 건축물이 주는 고문을 여러 차례 당해보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졸작 건물이 갖는 파워는 음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며,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졸작 건축가의 힘은 동급의 작곡가에 비해 막강하다고 하겠다. 물론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작품이 비전문가로부터 졸작이라는 혹평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입장에서, 건축에 대해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한 작곡가의 건축에 대한 편린을 건축가들이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일까 조금은 걱정이 된다. 특히, 위에 언급한 대형 건물설계자나 그 건물을 다르게 평가하는 분에게는 필자의 혹평에 기분 좋을 리 없겠지만 그만큼 건축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나는 미래에 떠나고 싶은 행복한 여행계획을 세우는 기쁨을 즐기는 편이다. 필자가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보는 두 가지는 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리고 낯섦과 경이로 다가오는 건축물들이다. 가깝게는 소쇄원과 부석사를 그리고 멀게는 뤼꼬브뷔제(Le Corbusier)의 롱샹성당과 가우디(Antoni Gaudi)의 사그라다 화밀리아 (Sagrada Familia)를 만나게 될 즐거움을 꿈꾸고 있다. 외국을 여행할 때 커다란 현대식 호텔보다는 그네들의 삶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숙소를 더 선호하는데, 이 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백년이 넘은 고옥(古屋)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처마를 멋들어지게 늘어뜨린 기와집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최근에는 펜션들이 마치 산불처럼 번져 농촌의 전원 풍경을 바꿔놓고 있으며, 도시에서는 아파트의 재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이라는 현실적인 명분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우리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추해지고 지저분해 지는 걸까?” 하는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고풍스러워 질 수는 없는 것인가? 유럽의 건축물처럼 수 십, 수 백년 동안 유지되도록 꼭 그렇게 지을 수는 없더라도, 좀 더 여유롭고 아름답고 개성 있게 지어져 세월의 흔적을 저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건축물을 도심 곳곳에서 만나고 싶은 바램이다. 오래된 현악기일수록 더 깊은 울림을 주듯이, 늘 우리 곁에 보금자리처럼 남아있어서 그저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공명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나 장소가 몹시도 그립다. 외국인들도 나처럼 우리 건축가의 작품을 보기 위한 여행 계획으로 설레이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며, 안전하고 우아하고 쾌적하여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한 삶의 터전을 주는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잘 배치된 아름다운 도시가 여러분을 통해 설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05년 5월19일
소리건축가 이혜성 /경원대학교 작곡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