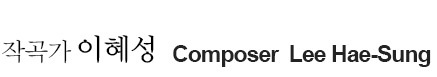정호승시인의 작업이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1 11:49관련링크
본문
시인 정호승의 서재 정호승의 서재는 어머니의 품속이다
http://ncc.phinf.naver.net/20140825_72/1408956373161a6TA4_JPEG/1_%C5%B8%C0%CC%C6%B2%B9%E8%B3%CA_646x220.jpg
서재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제 영혼이 충분히 인간으로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잠을 자면서 새로운 어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서재는 어떤 그 어머니의 가슴속과 같다. 이런 생각도 가져요. 왜냐하면, 만일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당신의 가슴에 나를 꼭 안아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재는 갓난아기와 같은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고. 또 때로는 젖도 먹여주는 그런 영혼의 어머니와 같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http://tv.naver.com/v/1219300
정호승
직업 시인
출생 1950년 1월 3일 (경상남도 하동)
학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석사
수상 2000년 제12회 정지용문학상
1989년 제3회 소월시문학상
저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슬픔이 기쁨에게>, <밥값>, <여행>, <서울의 예수> 외 다수
관련링크 통합검색 보러가기
책과 나의 이야기
영혼의 맛있는 쿠키, 책
책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어머니에 대한 비유를 들었지만, 책은 모유다. 어머니의 젖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나를 젖 먹이지 않았다면, 나는 한 인간으로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모유와 같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 자라고 나서 육체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모유를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단계에서 스스로 공급받을 수 있는 모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책이라는 모유를 우리가 먹지 못하고 산다면 어쩌면 육체마저도 건강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모유로 만든 어떤 영혼의 과자다. 맛있는 쿠키다. 뭐 이렇게 책을 제 나름대로 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다른 시인들도 그럴 거예요. 저는 단숨에 시를 쓰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고쳐 씁니다.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시 한 편 쓰는데 보통 서른 번 내지 마흔 번 정도 고쳐 쓰고요. 이제 그렇게 고쳐 쓰고 나서 초고가 완성되잖아요. 그럼 책상 앞에 둡니다. 지금 제 책상에도 초고의 시가 놓여있어요. 프린트된. 그럼 이제 뭐 책상에 앉아서 있다가 시간이 날 때 시간이 나면 자연스럽게 그 초고를 읽게 됩니다. 읽다가 보면은 어? 하면서 또 고치게 되지요. 그러면 또 프린트해서 또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고치게 되고. 문예지에 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예지가 저한테 오면 제가 발표한 시를 다시 읽으면서 또 고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낼 때 또 시집 그 초교지가 조판 돼서 오지 않습니까. 또 고칩니다.(웃음) 그래서 시를 쓰는 것도 이러한 끊임없는 어떤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다.
무슨 일이든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뭐 타고난 천부적 재능에 의해서 시를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노력이, 노력의 전체가 시를 쓰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모차르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살리에르인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시의 살리에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인 정호승의 서재 이미지 1
모든 사람은 다 시인이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시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의 주인은 누군가. 누굴까요? 한 편의 시가 있을 때, 그 시의 주인은 누구일까? 시를 쓴 사람이 아니고 시를 읽는 사람이 그 시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를 쓰고 나면 ′이 시는 읽는 사람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를 쓰는 사람과 시를 읽는 사람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다 어떤 그런 시가 가득 고여있다.
마더 테레사 수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인간에게서 신을 본다.′ 신. 저는 거기에서 ′ㄴ′ 자를 딱 떼서 ′모든 인간에게서 시를 본다.′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서 신성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성을 다 보신 거죠. 그런데 저는 모든 인간에게서 그 인간의 삶 속의 ′시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시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를 어디에서 발견할까요? 나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시는 인간의 삶 속에 있다. 그럼 인간의 어떠한 삶 속에 있느냐. 저는 결국 인간의 어떤 비극 속에 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의 어떤 비극성 속에서 저는 시를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당신의 시의 발화점. 그 발화점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면, ′인간의 비극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얻지 못해도 고통스럽고, 직장을 잃어도 고통스럽고, 직장생활을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또 일을 하지 않고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을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의 기쁨이 끊임없이 지속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사랑이 시작되면 사랑의 기쁨과 동시에 고통의 눈물이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없는 삶은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고통 그 자체가 바로 삶 자체예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 하나가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빅터 플랭클은 아우슈비츠 감방에서 가스실로 끌려갈 뻔하는 고통을 늘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인류에게 이 나치의 만행을 증언하자. 그래서 신의 도움이 있기도 했겠지만,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그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고통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해서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인생이기 때문에.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쌀에 아무리 돌이 많아도 쌀보다 더 많지 않다. 그렇잖아요. 쌀 속에 돌이 있지만, 쌀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고통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고통은 동일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고통에서 희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고통이든지 이 고통에서 가능한 한 나도 희망을 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어떤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영혼의 또 다른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지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시인 정호승의 서재 이미지 2
고통과 상처의 꽃으로 치유하다
제 시를 읽는 독자가 제 시를 통해서 마음의 어떤 그 위안과 평화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는요. 고통 속에서 피는 꽃이거든요. 이 고통의 꽃이에요. 상처의 꽃이에요. 시는. 저는 수련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수련은요. 이 물 밑의 흙탕물이에요. 오물. 오물의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고통이죠. 우리도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수련이 피우는 꽃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도 그 현실의 고통 속에서 피우는 그런 꽃과 같은 거다. 그래서 상처의 꽃 또는 고통의 꽃이다. 그런데 그 시의 꽃을 통해서 좀 평화를 느꼈으면 좋겠다. 좀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좀 위로와 위안을 느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시를 읽고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시는 이미 고통을 통과한 고통을 자양분으로 해서 피어난 그런 수련과 같은 시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이 산문집의 제목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예요. 그래서 이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는요. 우리 존재를 설정해 주는 그런 소중한 가치예요. 우리는 너와 나와의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의 본질을 보면요. 항상 좋지 않은 본질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는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관계가 힘이 들 때 미움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니뭐니해도 사랑이라는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다. 그래서 그 관계가 힘이 들 때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서 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지니는 것이 소중하다.
제가 제 손으로 풍경을 한 번 달아 본 적이 있어요. 산사에. 풍경을 달고 나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풍경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그 풍경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까? 바람 때문이잖아요. 바람도 풍경이 있어야 자기 존재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풍경과 바람. 바람과 풍경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미움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풍경일 때 당신은 바람이고, 내가 바람일 때 당신은 풍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설정 되어야만이 인생의 풍경 소리가 늘 아름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산문집을 통해서 내 인생의 관계는 미움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가. 사랑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가. 한 번 성찰을 해보자. 뭐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자
시인 정호승의 서재 이미지 3
행복은요. 순간이에요. 행복은 지속이 아니에요. 행복의 본질은 순간성이지 지속성이 아닙니다. 향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 라일락 꽃향기 맡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5월에 길을 가다 보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딱 뒤돌아 보면 라일락 향기가 스치는 거예요. 코끝에. ′아, 이 향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라일락 나무 아래서 계속 그 향기를 맡고 있으면 그것은 향기일까요, 냄새가 될까요? 냄새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복은 그러한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꽃향기와 같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맡을 수 있는 거지. 계속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의 향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의 영원성. 이러한 것이 행복이 우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이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많이 놓치고 살았어요. 앞으로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또 놓칠 것 같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들려주는 <풍경 달다>
저는 시를 못 외워요. 제 시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를 쓰는 일에 막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시를 외워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시를 한 편만 이야기를 하고 외워보라고 하면 ′풍경 달다′를 외울 수 있습니다. 외워 드릴까요?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풍경 달다>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짧으니까 외우는 겁니다.(웃음)
http://ncc.phinf.naver.net/20140825_72/1408956373161a6TA4_JPEG/1_%C5%B8%C0%CC%C6%B2%B9%E8%B3%CA_646x220.jpg
서재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제 영혼이 충분히 인간으로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잠을 자면서 새로운 어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서재는 어떤 그 어머니의 가슴속과 같다. 이런 생각도 가져요. 왜냐하면, 만일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당신의 가슴에 나를 꼭 안아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재는 갓난아기와 같은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고. 또 때로는 젖도 먹여주는 그런 영혼의 어머니와 같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http://tv.naver.com/v/1219300
정호승
직업 시인
출생 1950년 1월 3일 (경상남도 하동)
학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석사
수상 2000년 제12회 정지용문학상
1989년 제3회 소월시문학상
저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슬픔이 기쁨에게>, <밥값>, <여행>, <서울의 예수> 외 다수
관련링크 통합검색 보러가기
책과 나의 이야기
영혼의 맛있는 쿠키, 책
책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어머니에 대한 비유를 들었지만, 책은 모유다. 어머니의 젖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나를 젖 먹이지 않았다면, 나는 한 인간으로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모유와 같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 자라고 나서 육체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모유를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단계에서 스스로 공급받을 수 있는 모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책이라는 모유를 우리가 먹지 못하고 산다면 어쩌면 육체마저도 건강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모유로 만든 어떤 영혼의 과자다. 맛있는 쿠키다. 뭐 이렇게 책을 제 나름대로 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다른 시인들도 그럴 거예요. 저는 단숨에 시를 쓰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고쳐 씁니다.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시 한 편 쓰는데 보통 서른 번 내지 마흔 번 정도 고쳐 쓰고요. 이제 그렇게 고쳐 쓰고 나서 초고가 완성되잖아요. 그럼 책상 앞에 둡니다. 지금 제 책상에도 초고의 시가 놓여있어요. 프린트된. 그럼 이제 뭐 책상에 앉아서 있다가 시간이 날 때 시간이 나면 자연스럽게 그 초고를 읽게 됩니다. 읽다가 보면은 어? 하면서 또 고치게 되지요. 그러면 또 프린트해서 또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고치게 되고. 문예지에 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예지가 저한테 오면 제가 발표한 시를 다시 읽으면서 또 고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낼 때 또 시집 그 초교지가 조판 돼서 오지 않습니까. 또 고칩니다.(웃음) 그래서 시를 쓰는 것도 이러한 끊임없는 어떤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다.
무슨 일이든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뭐 타고난 천부적 재능에 의해서 시를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노력이, 노력의 전체가 시를 쓰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모차르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살리에르인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시의 살리에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인 정호승의 서재 이미지 1
모든 사람은 다 시인이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시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의 주인은 누군가. 누굴까요? 한 편의 시가 있을 때, 그 시의 주인은 누구일까? 시를 쓴 사람이 아니고 시를 읽는 사람이 그 시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를 쓰고 나면 ′이 시는 읽는 사람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를 쓰는 사람과 시를 읽는 사람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다 어떤 그런 시가 가득 고여있다.
마더 테레사 수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인간에게서 신을 본다.′ 신. 저는 거기에서 ′ㄴ′ 자를 딱 떼서 ′모든 인간에게서 시를 본다.′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서 신성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성을 다 보신 거죠. 그런데 저는 모든 인간에게서 그 인간의 삶 속의 ′시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시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를 어디에서 발견할까요? 나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시는 인간의 삶 속에 있다. 그럼 인간의 어떠한 삶 속에 있느냐. 저는 결국 인간의 어떤 비극 속에 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의 어떤 비극성 속에서 저는 시를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당신의 시의 발화점. 그 발화점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면, ′인간의 비극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얻지 못해도 고통스럽고, 직장을 잃어도 고통스럽고, 직장생활을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또 일을 하지 않고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을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의 기쁨이 끊임없이 지속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사랑이 시작되면 사랑의 기쁨과 동시에 고통의 눈물이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없는 삶은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고통 그 자체가 바로 삶 자체예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 하나가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빅터 플랭클은 아우슈비츠 감방에서 가스실로 끌려갈 뻔하는 고통을 늘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인류에게 이 나치의 만행을 증언하자. 그래서 신의 도움이 있기도 했겠지만,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그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고통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해서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인생이기 때문에.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쌀에 아무리 돌이 많아도 쌀보다 더 많지 않다. 그렇잖아요. 쌀 속에 돌이 있지만, 쌀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고통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고통은 동일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고통에서 희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고통이든지 이 고통에서 가능한 한 나도 희망을 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어떤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영혼의 또 다른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지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시인 정호승의 서재 이미지 2
고통과 상처의 꽃으로 치유하다
제 시를 읽는 독자가 제 시를 통해서 마음의 어떤 그 위안과 평화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는요. 고통 속에서 피는 꽃이거든요. 이 고통의 꽃이에요. 상처의 꽃이에요. 시는. 저는 수련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수련은요. 이 물 밑의 흙탕물이에요. 오물. 오물의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고통이죠. 우리도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수련이 피우는 꽃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도 그 현실의 고통 속에서 피우는 그런 꽃과 같은 거다. 그래서 상처의 꽃 또는 고통의 꽃이다. 그런데 그 시의 꽃을 통해서 좀 평화를 느꼈으면 좋겠다. 좀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좀 위로와 위안을 느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시를 읽고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시는 이미 고통을 통과한 고통을 자양분으로 해서 피어난 그런 수련과 같은 시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이 산문집의 제목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예요. 그래서 이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는요. 우리 존재를 설정해 주는 그런 소중한 가치예요. 우리는 너와 나와의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의 본질을 보면요. 항상 좋지 않은 본질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는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관계가 힘이 들 때 미움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니뭐니해도 사랑이라는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다. 그래서 그 관계가 힘이 들 때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서 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지니는 것이 소중하다.
제가 제 손으로 풍경을 한 번 달아 본 적이 있어요. 산사에. 풍경을 달고 나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풍경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그 풍경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까? 바람 때문이잖아요. 바람도 풍경이 있어야 자기 존재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풍경과 바람. 바람과 풍경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미움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풍경일 때 당신은 바람이고, 내가 바람일 때 당신은 풍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설정 되어야만이 인생의 풍경 소리가 늘 아름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산문집을 통해서 내 인생의 관계는 미움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가. 사랑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가. 한 번 성찰을 해보자. 뭐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자
시인 정호승의 서재 이미지 3
행복은요. 순간이에요. 행복은 지속이 아니에요. 행복의 본질은 순간성이지 지속성이 아닙니다. 향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 라일락 꽃향기 맡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5월에 길을 가다 보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딱 뒤돌아 보면 라일락 향기가 스치는 거예요. 코끝에. ′아, 이 향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라일락 나무 아래서 계속 그 향기를 맡고 있으면 그것은 향기일까요, 냄새가 될까요? 냄새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복은 그러한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꽃향기와 같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맡을 수 있는 거지. 계속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의 향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의 영원성. 이러한 것이 행복이 우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이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많이 놓치고 살았어요. 앞으로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또 놓칠 것 같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들려주는 <풍경 달다>
저는 시를 못 외워요. 제 시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를 쓰는 일에 막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시를 외워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시를 한 편만 이야기를 하고 외워보라고 하면 ′풍경 달다′를 외울 수 있습니다. 외워 드릴까요?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풍경 달다>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짧으니까 외우는 겁니다.(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