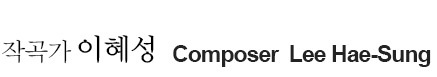후석(後石) 천관우 선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1 11:18관련링크
본문
후석(後石) 천관우 선생
김 정 남 (언론인)
1991년에 타계한 후석(後石) 천관우 선생 추모문집, 「우리 시대의 언관사관, 거인 천관우」 출판 기념회가 얼마 전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다. 그와 시대를 함께 했던 언론계의 후배, 사학계의 후학, 민주화 운동의 동지 등 62명이 그를 추억하고 기리는 글을 썼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를 추모했다. 이는 그의 사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늦어도 너무 늦었다.
천관우 선생, 그를 생각하면 그 동안의 내 협량과 무심이 한없이 부끄럽다.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가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고, 개인적인 그와의 사연도 나름대로 간직하고 있다. 광주의 피 위에 집권한 전두환의 취임단상에 임석하고, 그 정부 하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국정자문위원을 그가 맡으면서 민주화 투쟁 진영은 물론 어제까지 그를 모시고 따르던 동아∙조선투위의 기자들마저 발길을 끊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부음을 듣고도 빈소를 찾지 않았다. 그 옹졸과 못남을 뭐라 변명할 수 있으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만인의 존경을 받던 그가 어찌하여 만년의 그 한 때를 의연하게 버텨주지 못했나 그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누가 뭐래도 그는 당대 제일의 지사요 언론인이었고, 군계일학의 사학자였다. 그리고 이 나라 재야 민주화 투쟁의 남상이라 할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이끈 투사였다. 그랬던 그가 1980년 3월, 지식인 134인 선언에 참여한 것을 끝으로 민주화 투쟁과 결별했다. 이는 그를 위해서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 이후 그를 향해 쏟아진 비판과 의도적인 외면을 그는 외로움 속에서 감내해야 했고, 그것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죽기 전에 그가 손수 작성한 유서에서 자신의 묘지석에 다만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였던 천관우, 여기 잠들다”라고만 쓰게 한 것도 그 심사가 처연하기만 하다.
언관사관에서 민주화 운동의 중심으로
그가 1949년 7월에 대학의 학부졸업 논문으로 쓴 「반계 유형원 연구- 실학 발생에서 본 이조사회의 일단면」은 그 자체로 독보적이요, 실학연구의 단초를 연 것으로 역사학계의 전설로 남아있다. 그런 그가 학계를 떠나 임시수도 부산에서 언론계에 몸 담기 시작한 것은 우선은 다급한 생계 때문이었지만, 장지연∙박은식∙최남선∙신채호∙안재홍∙정인보∙문일평과 같은 언론인이면서 역사학의 선각자들을 사표로 삼았던 것과 무관치 않다. 과연 그는 지사풍 언론인의 맥과 전통을 이은 마지막 세대의 언론인이었다.
그는 “신문은 오늘의 역사요, 역사는 어제의 신문”이라면서 언관은 곧 사관(史官)이어야 한다는 언론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언론인의 가난과 고달픔을 맹자의 “하늘이 대임을 내릴 때는 먼저 심지와 근골을 괴롭힌다”는 말에 비추었고, 언론인의 자세를 “부귀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도 그 뜻을 바꾸지 못하며, 위무도 굴복시킬 수 없는 대장부”의 기상에 견주었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전 언론계로 확산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두고 “과연 언론은 일어섰다. 그것도 국내외에 그 소신을 떳떳이 밝힘으로써 이제는 후회가 없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일어섰다. 이 몇 해 만의 통쾌인가”하며 환호했다. 그러나 그 몇 달 뒤인 1975년 3월 새벽, 농성 중인 동아일보 기자들을 끌어내기 위해 회사측이 2백여 명의 폭도들을 동원했을 때 그는 “이 놈들아, 내가 다 보고 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외치며 그 현장을 모두 다 지켜봤다.
회사에서 축출당한 기자들이 기협회관 복도에서 “동아의 정통성은 폭도를 고용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언론을 사수하는 우리에게 있다”면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를 결성했을 때, 그는 이들 해직기자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었다. 해마다 이들 동아∙조선투위 기자들에게 친필로 연하장을 보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 해던가, 그는 청초(淸初)의 사상가 고염무의 ‘염치’라는 글을 인용, “송백은 추위가 와도 끝까지 시들지 않고, 닭은 비바람이 쳐도 울 때는 운다(松柏後凋於歲寒 鷄鳴不已於風雨)”라는 말로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려 애썼다.
1971년 4월 19일, 그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결성, 김재준∙이병린과 함께 3인 대표 중의 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이끈 것도 그였다. 유신정변 이후에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곧 그였고, 그가 곧 민주수호국민협의회였다. 스스로 원지를 긁어 성명을 발표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가 있어 민주화 투쟁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다.
그는 천도(天道)를 아는 역사학자였고, 직시(直時)의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당대의 언론인이었으며, 폭압의 시대에 민주화의 길을 개척해 온 선각자였다. 그가 한 마디 변명도 없이 청빈으로 일관한 것은 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만년의 행지(行止)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사표로 되지 못한 것은 못내 안타까운 일이다.
김 정 남 (언론인)
1991년에 타계한 후석(後石) 천관우 선생 추모문집, 「우리 시대의 언관사관, 거인 천관우」 출판 기념회가 얼마 전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다. 그와 시대를 함께 했던 언론계의 후배, 사학계의 후학, 민주화 운동의 동지 등 62명이 그를 추억하고 기리는 글을 썼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를 추모했다. 이는 그의 사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늦어도 너무 늦었다.
천관우 선생, 그를 생각하면 그 동안의 내 협량과 무심이 한없이 부끄럽다.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가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고, 개인적인 그와의 사연도 나름대로 간직하고 있다. 광주의 피 위에 집권한 전두환의 취임단상에 임석하고, 그 정부 하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국정자문위원을 그가 맡으면서 민주화 투쟁 진영은 물론 어제까지 그를 모시고 따르던 동아∙조선투위의 기자들마저 발길을 끊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부음을 듣고도 빈소를 찾지 않았다. 그 옹졸과 못남을 뭐라 변명할 수 있으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만인의 존경을 받던 그가 어찌하여 만년의 그 한 때를 의연하게 버텨주지 못했나 그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누가 뭐래도 그는 당대 제일의 지사요 언론인이었고, 군계일학의 사학자였다. 그리고 이 나라 재야 민주화 투쟁의 남상이라 할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이끈 투사였다. 그랬던 그가 1980년 3월, 지식인 134인 선언에 참여한 것을 끝으로 민주화 투쟁과 결별했다. 이는 그를 위해서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 이후 그를 향해 쏟아진 비판과 의도적인 외면을 그는 외로움 속에서 감내해야 했고, 그것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죽기 전에 그가 손수 작성한 유서에서 자신의 묘지석에 다만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였던 천관우, 여기 잠들다”라고만 쓰게 한 것도 그 심사가 처연하기만 하다.
언관사관에서 민주화 운동의 중심으로
그가 1949년 7월에 대학의 학부졸업 논문으로 쓴 「반계 유형원 연구- 실학 발생에서 본 이조사회의 일단면」은 그 자체로 독보적이요, 실학연구의 단초를 연 것으로 역사학계의 전설로 남아있다. 그런 그가 학계를 떠나 임시수도 부산에서 언론계에 몸 담기 시작한 것은 우선은 다급한 생계 때문이었지만, 장지연∙박은식∙최남선∙신채호∙안재홍∙정인보∙문일평과 같은 언론인이면서 역사학의 선각자들을 사표로 삼았던 것과 무관치 않다. 과연 그는 지사풍 언론인의 맥과 전통을 이은 마지막 세대의 언론인이었다.
그는 “신문은 오늘의 역사요, 역사는 어제의 신문”이라면서 언관은 곧 사관(史官)이어야 한다는 언론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언론인의 가난과 고달픔을 맹자의 “하늘이 대임을 내릴 때는 먼저 심지와 근골을 괴롭힌다”는 말에 비추었고, 언론인의 자세를 “부귀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도 그 뜻을 바꾸지 못하며, 위무도 굴복시킬 수 없는 대장부”의 기상에 견주었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전 언론계로 확산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두고 “과연 언론은 일어섰다. 그것도 국내외에 그 소신을 떳떳이 밝힘으로써 이제는 후회가 없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일어섰다. 이 몇 해 만의 통쾌인가”하며 환호했다. 그러나 그 몇 달 뒤인 1975년 3월 새벽, 농성 중인 동아일보 기자들을 끌어내기 위해 회사측이 2백여 명의 폭도들을 동원했을 때 그는 “이 놈들아, 내가 다 보고 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외치며 그 현장을 모두 다 지켜봤다.
회사에서 축출당한 기자들이 기협회관 복도에서 “동아의 정통성은 폭도를 고용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언론을 사수하는 우리에게 있다”면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를 결성했을 때, 그는 이들 해직기자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었다. 해마다 이들 동아∙조선투위 기자들에게 친필로 연하장을 보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 해던가, 그는 청초(淸初)의 사상가 고염무의 ‘염치’라는 글을 인용, “송백은 추위가 와도 끝까지 시들지 않고, 닭은 비바람이 쳐도 울 때는 운다(松柏後凋於歲寒 鷄鳴不已於風雨)”라는 말로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려 애썼다.
1971년 4월 19일, 그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결성, 김재준∙이병린과 함께 3인 대표 중의 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이끈 것도 그였다. 유신정변 이후에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곧 그였고, 그가 곧 민주수호국민협의회였다. 스스로 원지를 긁어 성명을 발표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가 있어 민주화 투쟁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다.
그는 천도(天道)를 아는 역사학자였고, 직시(直時)의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당대의 언론인이었으며, 폭압의 시대에 민주화의 길을 개척해 온 선각자였다. 그가 한 마디 변명도 없이 청빈으로 일관한 것은 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만년의 행지(行止)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사표로 되지 못한 것은 못내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