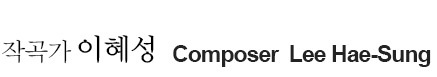어느 사이 굴레가 된 전통명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1 10:55관련링크
본문
어느 사이 굴레가 된 전통명절
이 지 양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농경사회의 절기를 지키던 수많은 명절은 저절로 유명무실해져서 이제 거의 잊혀졌다. 고작 설날과 추석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인데, 그 명절조차도 언제부턴가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거나 ‘역귀성,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명절 가족불화’라는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올해는 설날이 끝나기 무섭게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들린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족’을 그리워하고 특별한 정을 느끼면서도, 그 가족 안에서 저렇게 많은 문제가 빚어지는 것을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까.
연암의 제사 모시기
그런 뉴스를 보는 동안, 나는 잠시 실학자 박지원을 생각했다. 그는 예법이나 관습을 맹목적으로 지키기보다, 현실 조건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합리적 방법을 찾아나갔기 때문이다. 그는 야천(冶川) 박소(朴紹,1493~1534)라는 분의 8대 외후손으로서, 야천선생의 본손들이 묘를 직접 돌볼 수 없어 고민하는 것을 보고, 함께 제전(祭田)을 마련하여 그 고을의 호장(戶長)을 시켜 묘제를 모시게 했다.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책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일로 인해 구설수가 생기고 헛소문까지 더해져서, 연암에게 예법(禮法)을 모른다는 비판이 날아들었다. 연암은 헛소문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임을 밝히고, 호장에게 묘제를 맡긴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야말로 영구히 제사를 모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아전들이 있는 질청은 그 고을이 있는 날까지는 존속하므로 백대를 가도 제사를 폐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제사를 모셔달라고 토지를 맡겼다. 그러니 예법의 고금과 묘지기의 신분 귀천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묘지기를 택하여 묘제를 위탁한 것이다.
지금 시대를 연암이 살고 있다면, 그는 시아버지로서, 한집안의 어른으로서 앞장서서 명절의 의무를 과감히 덜어주지 않았을까? ‘이제는 사당을 두지도 않고 묘를 쓰지도 않는 시대다. 정말 효도를 하고 싶고 조상을 추모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서 조상을 빛내도록 해라. 설날과 추석처럼 그토록 귀한 연휴는 네 가족끼리 우선 행복하게 지내라. 교통이며 통신이 발달했으니 부모와 형제가 진정 그립거든 보통 때 주말에 만나자.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진정한 그리움과 정을 이어가고 살리는 길인 것 같다. 의무감과 도리보다 진정(眞情)을 앞서 헤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가족에게도 예의를 갖춰 감사하고 배려해야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런 것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가운데는, 사실은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 엄밀히 말하면 나와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타인인데, ‘가족’이라는 묶음으로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도리를 먼저 부여해버린 탓에, 그만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닐까? 예의를 갖추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이 그런 당위와 의무감 앞에서 오히려 섭섭함과 원망스러움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우리는 ‘가족’ 간에 서로 좀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좀 더 많은 ‘배려’를 하면서, 현실 생활의 변화된 조건을 고려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의무와 책임은 시선을 엄격하게 만들지만, 자유로움은 모든 것을 생생한 기쁨으로 살아나게 만드니까 말이다. 그런 자유가 선행되어야 만이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이 싱싱하게 살아나지 않을까?
많이들 ‘실학’을 입에 담지만, ‘실학’을 진정으로 지금의 삶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 때문에 아마도 일반인들은 ‘실학’이라는 말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실학 역시 전통주의나 복고주의, 국수주의의 일종으로 여기고 ‘과거의 학문’으로 느낄지도 모르겠다. 미래를 향한 진취적 논리, 혹은 현실 문제를 현재적 관점에서 타개하는 방법을 피부에 와 닿게 제시하진 않으니까 말이다. 진취성을 상실한 것은 어차피 복고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글쓴이 / 이지양
·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논문: 「연암 박지원의 생활 특징과 문화예술사상」(『한국한문학연구』36집, 2005)외 다수
· 번역서(공역): 『역주 매천야록(상)(하)』,문학과지성사,2005
『역주 이옥전집』,소명출판,2001
『조선후기 문집의 음악사료』,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2000
『조희룡전집』,한길아트,1998
이 지 양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농경사회의 절기를 지키던 수많은 명절은 저절로 유명무실해져서 이제 거의 잊혀졌다. 고작 설날과 추석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인데, 그 명절조차도 언제부턴가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거나 ‘역귀성,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명절 가족불화’라는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올해는 설날이 끝나기 무섭게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들린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족’을 그리워하고 특별한 정을 느끼면서도, 그 가족 안에서 저렇게 많은 문제가 빚어지는 것을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까.
연암의 제사 모시기
그런 뉴스를 보는 동안, 나는 잠시 실학자 박지원을 생각했다. 그는 예법이나 관습을 맹목적으로 지키기보다, 현실 조건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합리적 방법을 찾아나갔기 때문이다. 그는 야천(冶川) 박소(朴紹,1493~1534)라는 분의 8대 외후손으로서, 야천선생의 본손들이 묘를 직접 돌볼 수 없어 고민하는 것을 보고, 함께 제전(祭田)을 마련하여 그 고을의 호장(戶長)을 시켜 묘제를 모시게 했다.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책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일로 인해 구설수가 생기고 헛소문까지 더해져서, 연암에게 예법(禮法)을 모른다는 비판이 날아들었다. 연암은 헛소문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임을 밝히고, 호장에게 묘제를 맡긴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야말로 영구히 제사를 모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아전들이 있는 질청은 그 고을이 있는 날까지는 존속하므로 백대를 가도 제사를 폐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제사를 모셔달라고 토지를 맡겼다. 그러니 예법의 고금과 묘지기의 신분 귀천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묘지기를 택하여 묘제를 위탁한 것이다.
지금 시대를 연암이 살고 있다면, 그는 시아버지로서, 한집안의 어른으로서 앞장서서 명절의 의무를 과감히 덜어주지 않았을까? ‘이제는 사당을 두지도 않고 묘를 쓰지도 않는 시대다. 정말 효도를 하고 싶고 조상을 추모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서 조상을 빛내도록 해라. 설날과 추석처럼 그토록 귀한 연휴는 네 가족끼리 우선 행복하게 지내라. 교통이며 통신이 발달했으니 부모와 형제가 진정 그립거든 보통 때 주말에 만나자.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진정한 그리움과 정을 이어가고 살리는 길인 것 같다. 의무감과 도리보다 진정(眞情)을 앞서 헤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가족에게도 예의를 갖춰 감사하고 배려해야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런 것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가운데는, 사실은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 엄밀히 말하면 나와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타인인데, ‘가족’이라는 묶음으로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도리를 먼저 부여해버린 탓에, 그만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닐까? 예의를 갖추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이 그런 당위와 의무감 앞에서 오히려 섭섭함과 원망스러움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우리는 ‘가족’ 간에 서로 좀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좀 더 많은 ‘배려’를 하면서, 현실 생활의 변화된 조건을 고려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의무와 책임은 시선을 엄격하게 만들지만, 자유로움은 모든 것을 생생한 기쁨으로 살아나게 만드니까 말이다. 그런 자유가 선행되어야 만이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이 싱싱하게 살아나지 않을까?
많이들 ‘실학’을 입에 담지만, ‘실학’을 진정으로 지금의 삶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 때문에 아마도 일반인들은 ‘실학’이라는 말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실학 역시 전통주의나 복고주의, 국수주의의 일종으로 여기고 ‘과거의 학문’으로 느낄지도 모르겠다. 미래를 향한 진취적 논리, 혹은 현실 문제를 현재적 관점에서 타개하는 방법을 피부에 와 닿게 제시하진 않으니까 말이다. 진취성을 상실한 것은 어차피 복고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글쓴이 / 이지양
·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논문: 「연암 박지원의 생활 특징과 문화예술사상」(『한국한문학연구』36집, 2005)외 다수
· 번역서(공역): 『역주 매천야록(상)(하)』,문학과지성사,2005
『역주 이옥전집』,소명출판,2001
『조선후기 문집의 음악사료』,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2000
『조희룡전집』,한길아트,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