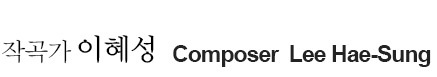오리아나 팔라치의 죽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1 10:54관련링크
본문
오리아나 팔라치의 죽음
오리아나 팔라치(Oriana Fallaci) 사망 기사를 며칠 전에 읽었다. 스러지는 ‘명물’의 시대를 불가불 떠올렸다. 이탈리아 출신의 ‘전설적 여기자’로 고인의 생애를 치장한 신문 제목에도 그만한 뜻이 담겨 있었던 셈이다.
현실 사회에서는 대하기 힘든 구전(口傳)의 세계가 곧 전설이라고 했을 때, 그녀의 살아생전 언행은 아닌게 아니라 유별스러웠다.
‘전설적’ 여기자의 ‘발칙한 인터뷰’
본인의 대명사로 통했던 ‘발칙한 인터뷰’ 행각이 특히 그랬다. 종전의 형식이나 내용을 무시하고 마침내 독보적이었던 팔라치 스타일로 한 세상을 똑 소리 나게 산 것이다. 당대 권력의 중추인 여러 나라 인사를 선택적으로 만나 높은 성가를 누리는 바람에, 팔라치와 인터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세계적 인물이 못된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위세를 떨쳤다.
열여섯 나이에 이탈리아 최대 주간지 ‘유럽인’의 특파원으로 베트남전쟁에 뛰어든 전력이 벌써 심상찮다. 장차 소설도 썼다. 그리스 군사독재에 항거한 레지스탕스 영웅 알렉산드로스 파타고리우스와 연인으로 지낸 외에는 독신으로 평생을 보냈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 독자에겐 생소한 이름이다. 이런 계제에 사사로운 이야기를 끼워 넣기 무렴하지만, 80년 이후 십수 년을 ‘인터뷰 업자’를 부업 삼아 밥을 벌던 나 역시 몰랐다. 한국 사회의 유명인사 백여 명과 회견을 하고 다니면서도 처음에는 몰랐다. 인터뷰에 관한 책이며 자료를 모으다가 차차 알게 되었다.
아 이런 사람의 이런 인터뷰도 있구나 탄복했다. 수박을 먹으며 이따금 트림을 하는 무하마드 알리의 쌍스러움을 참다 못해 그의 얼굴에 마이크를 집어 던졌다는 말에 놀랐다. 세 번째 트림까지 견디다가 “이런 무식한 촌놈을 챔피언이라고!” 소리치며 벌떡 일어서다니. 애들 문자로 ‘유쾌 상쾌 통쾌’를 맛보았다.
미국무장관 시절의 헨리 키신저도 당했다던가.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그건 팔라치의 창작”이라고 딴전을 피우자마자 “당신이 그래도 남자라고? 이 비겁자. 그 따위로 둘러대면 테이프를 공개하겠다”는 팔라치의 분통을 샀다. “내 일생의 최대 실수는 오리아나 팔라치의 인터뷰를 승낙한 것”이라는 한탄과 함께 두 번 죽은 꼴이다.
일본의 유명 인터뷰어인 아사히 신문 ‘미츠코’ 기자의 책「여성의 창조적 삶을 위한 지적(知的) 인생론 」(최명희 옮김. 制五문화사. 1980.)에 나오는 삽화다.
인터뷰 형태에는 대충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공격형과 무장해제형으로 나누는데 팔라치는 물론 전자다. 그리고 얼마나 도전적인가를 보여 준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우리는 물론 후자에 속한다. 우리 말의 구조 자체가 공격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은 여하간에, 애초에 대등한 관계를 마음먹기 어렵다. 문답 내용과는 별도로 의식해야할 인정과 관습과 겉치레가 무언의 간섭으로 미리 잠재하기 쉽다. 그 말 빼고 이 말을 넣어달라는, 너무나 한국적인 청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 거절하면 인터뷰 장사가 곤란할 지경이다.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사정이 많이 나아진 편이다. 어떤 주제로 누구와 얘기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각각 다를 것이므로 꼭 팔라치식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그녀의 어법에도 도그마가 적잖기 때문이다.
사람 대 사람의 소통을 생각한다
미츠코 기자가 역으로 그녀를 인터뷰한 자리에서, 일본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묻자 “맥아더 따위에게 진 나라”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중국에 관해서도 말했다. “인민복을 입은 중국 여성을 보면 울고 싶어진다. 그건 인간성에 대한 범죄”라고 비하했다.
퍽 문학적인 표현으로 재미 있지만 지나친 독단으로 비친다. 그랬던 팔라치도 인민복을 넘어 세상을 넘보는 중국에서 자신의 소설과 르포물을 번역 출판하기 위해 93년 가을 이 나라를 찾는다. 그보다 11년 앞서 등소평을 만났을 때만 해도 “천안문의 마오쩌둥 사진을 언제까지 내걸어둘 작정이냐”고 날 선 질문을 던졌거늘, 중국인들로부터 자기 나라 사정을 알리는 숱한 편지와 사진을 받으면서 태도를 바꿨다. “이 같은 교류를 통해 중국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할 정도로 유연한 자세를 취했다. (93년 10월 26일치 국내 신문.)
사는 일이 모두 인터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취직에 매달리는 청년을 비롯하여 어지간한 인간관계가 대강 그렇지 않은가.
‘인터뷰의 천재’에 대한 회상은 그러므로 사람 대 사람의 소통을 생각하는 시간에 다름아니다.
▶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글쓴이 / 최일남
· 소설가
· 前 동아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
·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 작품: <흐르는 북> <서울사람들> <누님의 겨울> <석류>
<어느 날 문득 손을 바라본다> 등
오리아나 팔라치(Oriana Fallaci) 사망 기사를 며칠 전에 읽었다. 스러지는 ‘명물’의 시대를 불가불 떠올렸다. 이탈리아 출신의 ‘전설적 여기자’로 고인의 생애를 치장한 신문 제목에도 그만한 뜻이 담겨 있었던 셈이다.
현실 사회에서는 대하기 힘든 구전(口傳)의 세계가 곧 전설이라고 했을 때, 그녀의 살아생전 언행은 아닌게 아니라 유별스러웠다.
‘전설적’ 여기자의 ‘발칙한 인터뷰’
본인의 대명사로 통했던 ‘발칙한 인터뷰’ 행각이 특히 그랬다. 종전의 형식이나 내용을 무시하고 마침내 독보적이었던 팔라치 스타일로 한 세상을 똑 소리 나게 산 것이다. 당대 권력의 중추인 여러 나라 인사를 선택적으로 만나 높은 성가를 누리는 바람에, 팔라치와 인터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세계적 인물이 못된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위세를 떨쳤다.
열여섯 나이에 이탈리아 최대 주간지 ‘유럽인’의 특파원으로 베트남전쟁에 뛰어든 전력이 벌써 심상찮다. 장차 소설도 썼다. 그리스 군사독재에 항거한 레지스탕스 영웅 알렉산드로스 파타고리우스와 연인으로 지낸 외에는 독신으로 평생을 보냈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 독자에겐 생소한 이름이다. 이런 계제에 사사로운 이야기를 끼워 넣기 무렴하지만, 80년 이후 십수 년을 ‘인터뷰 업자’를 부업 삼아 밥을 벌던 나 역시 몰랐다. 한국 사회의 유명인사 백여 명과 회견을 하고 다니면서도 처음에는 몰랐다. 인터뷰에 관한 책이며 자료를 모으다가 차차 알게 되었다.
아 이런 사람의 이런 인터뷰도 있구나 탄복했다. 수박을 먹으며 이따금 트림을 하는 무하마드 알리의 쌍스러움을 참다 못해 그의 얼굴에 마이크를 집어 던졌다는 말에 놀랐다. 세 번째 트림까지 견디다가 “이런 무식한 촌놈을 챔피언이라고!” 소리치며 벌떡 일어서다니. 애들 문자로 ‘유쾌 상쾌 통쾌’를 맛보았다.
미국무장관 시절의 헨리 키신저도 당했다던가.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그건 팔라치의 창작”이라고 딴전을 피우자마자 “당신이 그래도 남자라고? 이 비겁자. 그 따위로 둘러대면 테이프를 공개하겠다”는 팔라치의 분통을 샀다. “내 일생의 최대 실수는 오리아나 팔라치의 인터뷰를 승낙한 것”이라는 한탄과 함께 두 번 죽은 꼴이다.
일본의 유명 인터뷰어인 아사히 신문 ‘미츠코’ 기자의 책「여성의 창조적 삶을 위한 지적(知的) 인생론 」(최명희 옮김. 制五문화사. 1980.)에 나오는 삽화다.
인터뷰 형태에는 대충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공격형과 무장해제형으로 나누는데 팔라치는 물론 전자다. 그리고 얼마나 도전적인가를 보여 준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우리는 물론 후자에 속한다. 우리 말의 구조 자체가 공격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은 여하간에, 애초에 대등한 관계를 마음먹기 어렵다. 문답 내용과는 별도로 의식해야할 인정과 관습과 겉치레가 무언의 간섭으로 미리 잠재하기 쉽다. 그 말 빼고 이 말을 넣어달라는, 너무나 한국적인 청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 거절하면 인터뷰 장사가 곤란할 지경이다.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사정이 많이 나아진 편이다. 어떤 주제로 누구와 얘기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각각 다를 것이므로 꼭 팔라치식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그녀의 어법에도 도그마가 적잖기 때문이다.
사람 대 사람의 소통을 생각한다
미츠코 기자가 역으로 그녀를 인터뷰한 자리에서, 일본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묻자 “맥아더 따위에게 진 나라”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중국에 관해서도 말했다. “인민복을 입은 중국 여성을 보면 울고 싶어진다. 그건 인간성에 대한 범죄”라고 비하했다.
퍽 문학적인 표현으로 재미 있지만 지나친 독단으로 비친다. 그랬던 팔라치도 인민복을 넘어 세상을 넘보는 중국에서 자신의 소설과 르포물을 번역 출판하기 위해 93년 가을 이 나라를 찾는다. 그보다 11년 앞서 등소평을 만났을 때만 해도 “천안문의 마오쩌둥 사진을 언제까지 내걸어둘 작정이냐”고 날 선 질문을 던졌거늘, 중국인들로부터 자기 나라 사정을 알리는 숱한 편지와 사진을 받으면서 태도를 바꿨다. “이 같은 교류를 통해 중국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할 정도로 유연한 자세를 취했다. (93년 10월 26일치 국내 신문.)
사는 일이 모두 인터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취직에 매달리는 청년을 비롯하여 어지간한 인간관계가 대강 그렇지 않은가.
‘인터뷰의 천재’에 대한 회상은 그러므로 사람 대 사람의 소통을 생각하는 시간에 다름아니다.
▶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글쓴이 / 최일남
· 소설가
· 前 동아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
·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 작품: <흐르는 북> <서울사람들> <누님의 겨울> <석류>
<어느 날 문득 손을 바라본다> 등